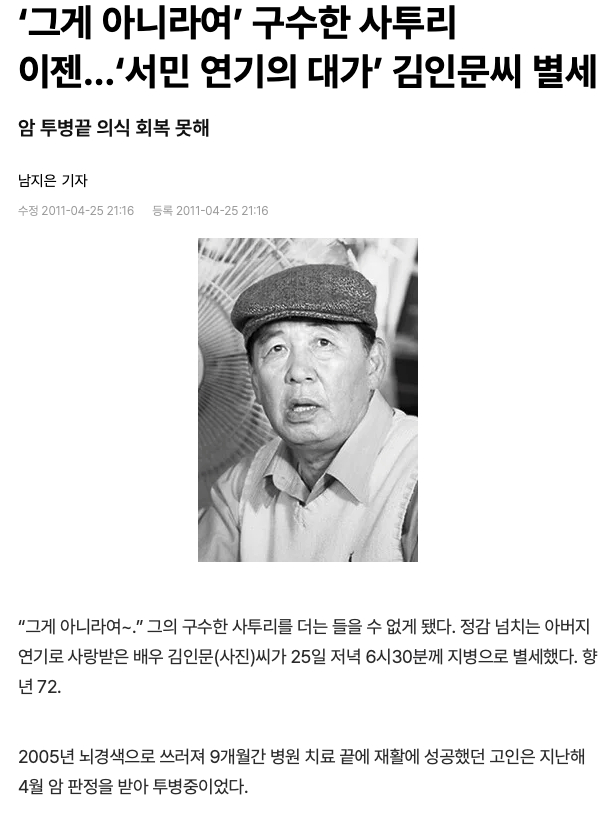
지난(2011년) 4월 25일 타계한 배우 김인문의 부고 기사다. 고인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이 기사도 정말 아쉽다. 기사에는 한 시대를 살아 간 예인의 삶과 죽음이 무미건조하고 상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고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료만 들춰보고 얼마든지 써낼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죽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는 한 사람이 평생 밟아 온 삶의 궤적이 압축되어 담겨 있다. 죽음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극적인 계기이며, 그렇게 돌이켜 보는 고인의 삶의 과정이 죽음이라는 드라마의 플롯이 된다. 또 감정 반응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정서적 사건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의 죽음도 그럴진대, 잘 알려진 사람의 죽음에는 이러한 요소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이 보여주는 드라마를 통해 고인과 자신이 함께 얽혔던 과거를 추억하고, 고인의 삶이 드리운 그늘을 떠올려 보며, 고인이 남긴 궤적을 다시금 음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드라마를 글로 잘 전달한 것이 잘 쓴 부고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부고 기사는 마치 배우 김인문의 이력서를 읽는 듯하다. 그의 경력, 겉으로 드러난 그의 활동은 알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을 읽을 수 없으며 그가 어떤 체취를 지닌 사람이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주간지 <타임>에는 매주 유명인의 부고를 전하는 ‘Milestones’라는 지면이 있다. 이 잡지 2010년 12월13일자에는 11월 28일에 사망한 배우 레슬리 닐슨의 부고 기사가 실려 있다. <총알 탄 사나이>의 그 레슬리 닐슨이다.
2010년 11월 28일 자, 「총알탄 사나이」의 코믹 배우 레슬리 닐슨 (Nielsen) 부고기사는 “1993년에 펴낸 자서전 ‘Naked Truth’에서도 그의 코믹한 개성을 살렸다. 자신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거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염문을 뿌렸다거나 한때 농담중독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았다는 둥 코믹한 허구를 채워 넣었다”는 책의 한 대목을 따 와 닐슨의 캐릭터를 간명하게 드러낸다.
2010년 11월 28일 자, 코믹 배우 레슬리 닐슨 부고기사는 낭만적 영웅 역할에서 코믹배우로 전환한 그의 배우인생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1988 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닐슨은 ‘연기자 생활 35년간 나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연기를 해온 게 아닌가 조금씩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역을 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부고 기사는 닐슨이 등장한 한 영화(<Airplane!>)에 나온 농담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저 그런 농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화사에 기록된 명대사 중 하나다. 게다가 기사가 머릿글감으로 선택한 이 영화는 배우 닐슨에게 매우 중요한 영화다. 그가 심각한 배우에서 코미디 배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기사는 320단어로 된 3단짜리 짧은 글 안에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의 부모, 형제는 누구인지까지 다 밝혀 넣었으며, 작품들도 그저 나열하지 않고 그의 생애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거론했다. 마무리는 역시 그가 남긴 유명한 농담을 인용하는 것으로 했다. 폭넓게 사랑받은 코미디 배우의 부고 기사로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부고 기사를 쓴 리처드 콜리스는 67세의 영화 전문 기자다. 영화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 만 하고, 더구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마디쯤 할 수 있는 연배의 사람이다. 짧으면서도 깊이 있는 부고 기사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잡지라서 그런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닐슨이 숨을 거둔 다음날 나온 신문 기사들도 마찬가지다. <뉴욕 타임스> 부고 기사에는 “1960~70년대에 그의 머리가 하얗게 세기 시작하자 그는 더욱 비중 있는 인물을 맡기 시작했다. 군 지휘자, 정부 지도자, 심지어 깡패 두목까지 연기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가 1993년에 펴낸 자서전 <Naked Truth> (물론 ‘총알 탄 사나이(The Naked Gun)’의 패러디)조차 아카데미 상 두 차례 수상, 엘리자베스 테일러와의 염문 같은 코믹한 허구로 채워 넣었다는 부분도 있다.
<LA 타임스>의 부고 기사는 닐슨 자신의 발언들을 효과적으로 인용하여 그의 배우 인생을 되짚어 보았다. 여기서도 <Airplaine!> 에피소드는 빠지지 않았다.
레슬리 닐슨과 김인문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부고 기사를 평면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의 부고 기사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죽음을 대하는 방식, 이러한 죽음을 기사로 표현하는 방식을 보자는 거다. 게다가 김인문이 못할 것은 뭔가. 그의 삶을 뒤적여 보면 닐슨 못지않은 드라마가 한가득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의 부고 기사는 최소한 동년배의 초상 몇 건쯤은 치러 본 논설위원급 기자가 쓰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살아서 펄펄 뛰는 자만이 아니라 늙고 병들어 사라져 가는 자도 기억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글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죽음이라는 무게에 걸맞는 짐을 지고 모니터 앞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죽음이라는 마지막 드라마의 주인공인 고인을 독자가 공감할 수 있게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